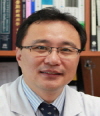
법대의 장점은 법조인이 되는 기간이 의대보다 짧고-경우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지만-굳이 외국 연수를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단점이라면 모든 법대 입학생이 법조인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만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라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로서 생각해 보았었다.
사회에 나와 보니 의대는 의사가 안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반해 법대 졸업생은 굳이 법조인이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법조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그럴 힘이 없다. 그저 우리 사회가, 정부가 정해준 룰에 따를 뿐이다. 의료수가라는 것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도 속수무책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데도 정부는 당당하니 환장할 일이다.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심사평가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잘못 항의했다가는 아니 질문만 삐딱하게 해도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정부가 얼마나 의사를 우습게 알면 심사평가원장에 아예 의사 출신은 배제한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나.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사기 칠 수 있으니 꼭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면 신고하라고 방송까지 한다. 잘하면 상품도 준단다. 그래도 의사들은 항의조차 못한다.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법과 아청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르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준 범죄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독히 의사들에게 부정적이다.
법조인들도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일수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한 나라의 의료를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에 의사출신이 해본지는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오래 전에 잠깐 있던 일이다. 법무부 장관에 법조인이 아닌 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와중에 의료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실제로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그 어떤 직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의사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의사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다. 의사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의료 환경은 갈수록 왜곡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말이다.
현직 교수 출신으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 그래서인지 교수가 뭣 하러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출마한 이유는 의사회가 바닥을 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회가 갈수록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장이 목에 칼을 긋고 상임이사가 민주노총 집회장에 가서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이슈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의료인들의 분노를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 의료는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에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했다.
교수를 반기지 않는 개원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고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된 상대 후보의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선거 운동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게다가 나름 전국조직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상대로 무척이나 낮은 투표율 하에 승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 같다.
낙선자가 말이 많으면 볼썽사납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상책이고 미덕으로 보인다.
이제 다시 대학 교수로 돌아오고 보니 세상 편하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쉬움은 남지만 익숙한 것이 편하다던가. 선거 운동 기간이라 면책이 되었던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밤 11시에 학교서 돌아오는 고 3 딸아이를 데리러 가는 임무가 당장 떨어졌다. 의사회도 우리 사회 곳곳이 그렇듯이 혼란스러운 시기다.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가 있지 않고는 의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