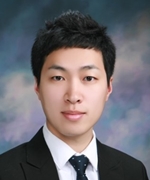
지난해 12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이 진행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도 40여명. 얽히고 설킨 인물들 간의 관계만큼이나 어떻게든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이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재판 전략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첫째는 ‘모르쇠’형이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최순실 씨다.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강요, 이대 학사 비리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최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의 태도까지 보인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과는 ‘레이저 눈빛’을 쏘며 매서운 설전을 주고받다가도 재판부 앞에서는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등 하소연을 쏟아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아예 알지 못했으며 대통령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승마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가 아니다"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여한 바 없다”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이 유형에 가깝다.
두 번째 유형은 ‘내부 고발자’형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되 윗선에 책임을 넘기는 전략을 취한다. 이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협조는 순수한 양심 고백보다는 추가 기소를 피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세 번째 유형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림자’형이다. ‘문고리 3인방’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간단한 증거조사만 거친 뒤 사실상 재판을 마친 상태다. 최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씨도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들의 선택에는 재판을 단기에 끝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은 무엇일까.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모르쇠’나 지연 전략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재판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박 전 대통령이 ‘정면 승부’를 펼칠 마지막 기회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주장해온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때다.


